728x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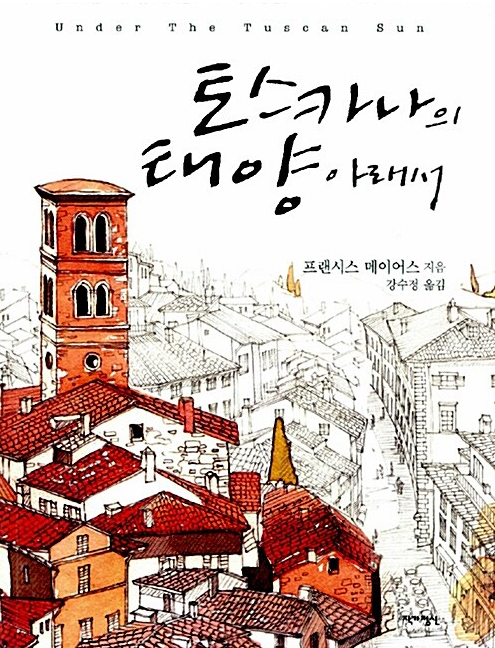
토스카나의 태양 아래서 / 프랜시스 메이어스 지음, 강수정 옮김. 작가정신 (2011)
오래된 나들이용 은식기를 조금 챙겨 왔고, 잔과 접시를 몇 개 샀다. 처음으로 만든 파스타는 천상의 맛이다. 오랜 노동 끝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모조리 먹어치우고 밭일하는 일꾼처럼 침내에 너부러진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훈제하지 않은 생베이컨인 판체타를 깟둑썰기로 썰어서 센불에 볶다가 크림을 붓고, 진입로나 축대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야생 아르굴라(여기서는 루케타라고 부른다)를 넣어 만든 단순한 스파게티다. 그걸 접시에 수북이 담고 파마산 치즈 가루를 듬뿍 뿌려 먹는다. - p.50
얼마 있다가 마르티니 씨가 도착한다. 그는 잣송이를 집어들더니 돌담에 대고 톡톡 친다. 검은 알갱이가 떨어진다. 그걸 돌멩이로 깨서 껍질에 싸인 타원형의 씨앗을 집어 든다. "피놀로." 그러면서 진입로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거무스름한 구슬들을 가리킨다. "토르타 델라 논나(할머니의 타르트)." 행여 내가 그 씨앗들의 가치를 모를까 봐 알려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여섯 뿌리를 심었을 뿐인데 무성하게 자라준 바질과 함께 페스토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나는 샐러드에 잣을 뿌리는 것도 좋아한다. 잣! 그런데 그걸 지금껏 생각 없이 밟고 다닌 것이다. (중략) 삼십 분 동안 잣을 깟더니 네 숟가락 정도가 나온다. 손은 온통 까맣고 끈적거린다. 미국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파는 잣이 그렇게 비싼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탈리아 디저트의 처음이자 끝인 것처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토라타 델라 논나를 만들어볼 작정이다. (중략) 우선 달걀노른자 두 개와 밀가루 1/3컵, 우유 2컵, 그리고 설탕 1/2컵으로 걸쭉한 커스터드를 만든다.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많아져서 두 개 분량은 나중에 쓰려고 그릇에 담아둔다. 커스터드가 식는 동안 반죽을 한다. 폴렌타 1과 1/2컵, 밀가루 1과 1/2컵, 설탕 1/3컵, 베이킹파우더 1과 1/2티스푼을 혼합한 후 여기에 버터 1.8킬로그램, 그리고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 전부 넣어서 잘 섞는다. 반죽은 들로 나눈 뒤 하나는 파이용 팬에 잘 펴고, 그 위에 커스터드를 덮은 다음 남은 반죽을 펼치고, 또다시 커스터드를 덮은 후 반죽의 끝을 모아서 주름 모양으로 잘 매만진다. 살짝 볶은 잣 한 줌을 위에 뿌린 다음 180도의 오븐에서 이십오 분간 굽는다. 부엌은 이내 그럴듯한 냄새로 가득 찬다. 다 된 것 같은 냄새가 났을 때 황금빛으로 노릇하게 구워진 토르타를 부엌 창턱에 올려놓고 마르티니 씨에게 전화를 건다. "제가 만든 토르타 델라 논나가 완성됐어요." 얼마 후 도착한 그에게 나는 우선 에스프레소 한 잔을 끓여낸 후 토르타를 커다랗게 한 쪽 잘라 대접한다. 포크로 한입 떠 넣은 그의 눈에 꿈꾸는 듯한 표정이 어린다. "페르펙토." 완벽하단다. -p.111
우리 집안 여자들은 늘 브레드 앤 버터 피클, 포도 젤리, 수박껍질 피클, 그리고 복숭아 프리저브와 자두 버터를 만들어왔다. 나도 김이 설설 나는 주전자, 살이 금방 물러서 먹다 보면 싱크대에 즙이 뚝뚝 떨어지는 라즈베리 한 바구니, 곧 식초물에 잠길 달콤한 정향 냄새 나는 복숭아, 약손가락 크기만 한 오이를 보면 마음이 끌린다. 캘리포니아의 집에서도 찐득하게 녹아내린 고무마개 때문에, 잼이 되지 못한 잼 때문에, 투명하면서도 어딘가 이국적인 느낌의 황옥색이 되기는커녕 스물댓 개의 병을 회색 젤리로 채워버린 구아바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다. 진홍색과 에메랄드색 과일 프리저브 병을 가지런히 늘어놓고 이탈리아어로는 소타체토(식초에 절인다는 뜻)라고 부르는 피클을 뚝딱 만들어내던 엄마의 유전자를 물려받지 못한 모양이다. 오후 내내 땀 흘려 만든 걸 보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보톨리누스 식중독'뿐일까? - p.126
부엌 문 앞에 바질 화분을 가져다놓은 건 파리를 쫓아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축대를 세우고 우물을 파는 동안 인부 한 명이 말벌에 쏘인 부위에 바질 잎을 으깨서 문지르는 걸 봤다. 그렇게 하면 통증이 싹 가신다고 했다. 화분 말고 조금 떨어진 넓은 터에서도 바질이 자란다. 자르면 자를수록 더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다. 잎을 그대로 샐러드에 넣고, 페스토도 많이 만들고, 호박이나 토마토 요리에도 듬뿍 넣는다. 많고 많은 허브 중에서 토스카나 여름의 정수를 담고 있는 건 바로 바질이다. - p.200
서이탈리아에는 에스프레소가 그야말로 지천이다. 피아차에 앉아 있으면 커피 머신에서 증기를 뿜을 때 나는 슈욱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온다. 토스카나에서 여름을 보낸 첫 해에 에드가 카운터에서 "운 카페"라고 짧게 주문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을 열심히 쳐다보던 게 기억난다.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사람이 드물었다. 처음엔 그가 이탈리아 사람처럼 주문하면 바텐더들이 되묻곤 했다. "노르말레?" 관광객이 실수를 하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약간의 놀라움을 담아 노르말레라고 부르는 커다란 잔의 갈색 커피를 주문한다. "시, 시. 노르말레."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초조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단호한 어조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더 이상 아무도 되묻지 않았다. 그는 현지인들이 그걸 한 모금씩 나눠 마시는 대신 단숨에 들이켜는 걸 봤다. 카페마다 일리, 라바차, 산디, 리버 등 서로 다른 브랜드의 커피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러더니 위에 뜬 크레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항상 블랙으로 마셨다. "사는 게 달콤하신가 보군요. 커피를 그렇게 쓰게 드시는 걸 보니." 어느 카페 바리스타의 말을 듣고서야 에드는 카페마다 설탕 통이 있고, 바텐더가 접시와 스푼을 내려놓을 때 설탕 통을 어떻게 밀어야 활짝 열리는 지를 알게 됐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설탕을 엄청나게 탄다. 듬뿍 퍼서 두세 스푼은 기본이다. 어느 날 부터인가 에드도 그렇게 설탕을 들이붓고 있는 걸 본 나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하면 거의 디저트가 되거든." 그걸 설명이라고 하는 건지. 두 번째로 이탈리아를 찾았던 여름이 끝나갈 무렵 그는 피렌체에서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에 독수리 장식이 있고 손으로 돌리는 고전적인 에스프레소 기계인 라 파보니를 사들고 집으로 갔다. 나는 침대에서 카푸치노를 받아 마시는 호사를 누렸고, 집을 찾은 손님들도 저녁식사가 끝나면 에드가 이탈리아에서 사 온 자그마한 컵에 에스프레소를 마셨다. 여기서도 라 파보니를 한 대 샀는데, 이번 건 자동이다. 그는 집에 있건 마을에 있건, 이 묘약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잔 더 마신다. 그는 크레마를 살펴본 뒤 컵을 한 번 젓고는 단숨에 마신다. 뭐, 그게 잠을 잘 수 있는 힘을 준다나. - p.311
예전에 "나는 프랑스 샤토에 산다"도 그렇지만 유럽에 집 한채 장만하는 건 어지간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로망과도 같은 일인 듯 하다.
물론 외국인 입장에서 오래된 집을 수리하는 과정은 악몽과도 같지만 우물 공사 하다가 발견되는 고대 로마 시절 저수지의 흔적이라던가 사방에 잡초처럼 자라나는 허브들을 잘라서 요리하는 모습은 천국과도 같다.
이탈리아 여행을 꿈꾸게 만드는 책. 책에 등장하는 레시피 따라서 몇몇 요리를 만들다 보면 이탈리아 느낌을 만끽할 수 있을까?




댓글